첫째날
6. 운 : 밤의 축제
여유롭게 리듬을 타던 크라잉넛이 벼락같이 내달린다.
다 같이 닥치고, 바람을 가르며 말을 달리자!
지금 내 기분은? 크라잉넛이 옆에 있으면 어깨동무하고 책상 위로 펄쩍 뛰어오를 만큼, 끝내준다. 정신 빠지게 〈말달리자〉를 부르짖던 우리는 이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좋지 아니한家〉 묻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대답을 해 줘야, 노래에 대한 예의잖아?
“좋지! 왜 안 좋아? 좋아, 좋아 죽겠어!”
후아, 말 춤으로는 부족하다! 방을 쿵쿵 울리는 자유로운 리듬에 맞춰 목이 부러지게 헤드뱅잉하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막 째진다. 음악의 신이라도 내린 것처럼, 멋지게 기타 치는 흉내를 내며 머리를 앞뒤로 흔들다가 드럼을 치듯 손가락으로 옷장도 마구 두드린다. 내친김에 아예 온몸을 이불로 둘둘 감고 방바닥을 데굴데굴 굴러도 본다. 아싸! 오늘밤엔 뭘 해도 좋다!
벌써 몇 번째 떠올리는지 모른다. 깜짝 놀라더니 곧장 눈가가 부드러워지던 린의 얼굴을 평생 못 잊을 거야! 현관문만 열면 보이는 자리에 가방을 세워 둔 내 나름의 작전이 제대로 먹혀들었다.
“다녀왔습니다.”
학교에 찌든 얼굴로 들어선 린은, 꿈꾸던 세계로 통하는 비밀의 문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리고 안 그래도 큰 눈을 더 크게 떴다. 눈을 감으면 세상이 사라질까 겁내는 어린아이처럼. 한참 뒤에야 커다란 갈색 눈동자가 수줍게 시선을 돌려 나를 쳐다보더니, 가볍게 깜빡거렸다.
“네 거야. 어디로 도망 안 가, 걱정 마.”
나는 희망을 담아 웃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와!”
그제야 린은 짧은 숨을 토해 내며 달려가 가방을 얼싸안았다.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안고 털에 얼굴을 비빌 때처럼, 린은 세상을 다 가진 해맑은 아이의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어디서 산들바람이라도 불어오듯, 내 심장까지 부드럽게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 가슴 밑바닥부터 따듯한 온기가 차오른 건 오늘이 처음이다. 우리집엔 누구도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없게 만드는, 서러운 슬픔이 늘 맴돈다. 하지만 오늘밤은 웬일로, 어떤 일에도 무관심한 내 뇌조차,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활짝 웃느라 바쁠 지경이다.
내 걱정과는 달리, 린은 가방을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와락 끌어안고 속삭이듯 말했다.
“오빠, 최고! 오빠 밖에 없어! 나한텐 정말 오빠뿐이야.”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옷장 문 사이로 무지하게 큰 옷걸이 하나가 보란듯이 삐죽이 튀어나와 있지만, 상관없어. 나는, 굶주린 조카를 위해 빵 쪼가리를 훔친 장발장처럼, 해야만 하는 일을 한 거야. 아님 말고.
창문을 열고 좁은 마당을 내다본다. 차가워지는 가을 밤공기 속에 맨드라미들이 어깨를 살짝 움츠리고 옹기종기 모여 있다. 꽃도 밤에는 잠을 자나? 그럼 단체로 수면제라도 먹은 것처럼 푹 자는 거야! 오늘 일은 모두 잊어.
수수한 맨드라미 아래 간직한 나만의 비밀을 바라보며, 축축한 비바람 냄새를 흠뻑 들이마신다. 후아,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하다. 낡은 함석지붕을 두드리는 가늘고 세찬 빗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며 빗방울을 튕겨 내는 맨드라미의 부드러운 움직임, 건조하고 서늘한 땅이 수분을 빨아들이는 소리에 눈을 감는다. 가슴으로 선율을 그리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머릿속 오선지에 나만의 음표와 말을 채워 나간다. 드디어 비와이에, 스윙스, MC 스나이퍼마저 인정할 정도로 끝내주는 곡을 완성하는 순간, 내 안의 모든 소리가 파도처럼 나를 덮치고 흩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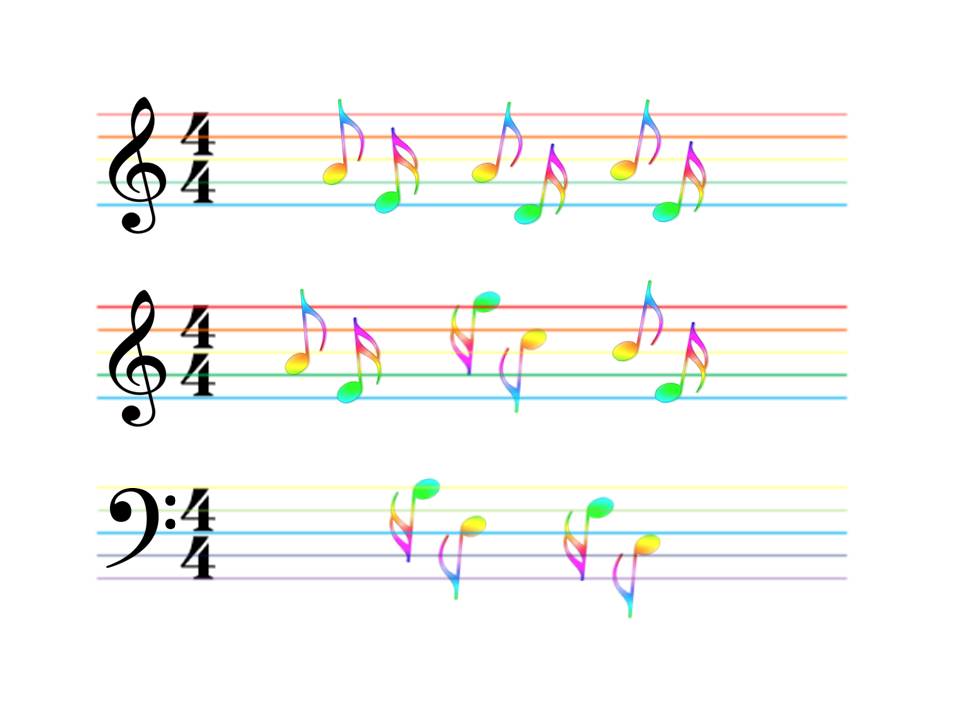
다시금, 크라잉넛의 경쾌한 목소리가 내 귀를 신나게 때린다. 나는 그들과 함께 즐겁게 노래한다.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개떡같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린과 같이 있음이 좋지 아니하냐며 계속해서 묻고, 또 대답한다. 그렇잖아? 안 그래? 그래! 그래, 진심으로.
아싸! 오늘밤의 기쁜 축제가 끝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밤새 이 곡만 무한 반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