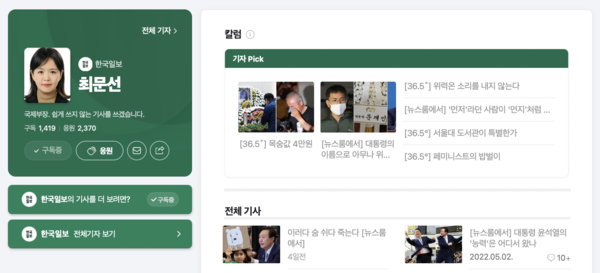
“쉽게 쓰지 않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최문선 기자의 네이버 기자홈 소개 글에 올라와 있는 문구다. 2000년 2월 공채에 합격해 한국일보에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지금까지 같은 회사에 몸담고 있는 23년차 중견 기자다. 사회부, 국제부, 정치부, 문화부 등 다양한 부서를 거쳐 지난 2019년에는 50년 만에 한국일보 여성 정치부장으로 선임됐다. 올해 5월부터는 국제부장을 맡고 있다. 현재는 데스크로 근무해 자신의 바이라인을 단 기사를 내진 않지만 달마다 게재되는 칼럼을 통해 그의 글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10월 14일 최 기자에게 인터뷰 요청 메일을 보냈다. 이틀 뒤 답장이 왔다. 국제부장을 맡고 있는 최 기자는 세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대면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흔쾌히 서면 인터뷰에 응했다. 첫 답장이 오고 2분 뒤 다시 메일이 왔다. 이름을 ‘서유정’이라고 잘못 적어 보내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마감으로 정신이 없었다는 그의 답장을 통해 얼마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이후 메일 30통과 전화 통화를 주고받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부서에 전화가 와서 받으면 정치부장을 바꿔달래. 전화를 받고 있는 내가 당연히 여성 직원인 줄 아는 거지. 그러면 상대방에게서 ‘헉, 부장이 남자일 줄 알았다’는 말이 되돌아 와. 오랫동안 ‘정치부장’이 40~50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거지.”
(출처: 한국여성기자협회 인터뷰 ‘50여년 만의 한국일보 여성 정치부장 – 최문선’)
지난 2019년 한국일보는 최 기자를 정치부장으로 선임했다. 당시 기자협회보에서 발행된 기사에 따르면 1970년대 언론사 첫 여성 정치부장으로 알려진 이영희 기자 이후 한국일보에서 50여 년 만에 여성 정치부장이 등장한 것이었다. 위 기사에서 이태규 한국일보 편집국장은 “여성이라 일부러 배치한 건 아니”라며 “최 부장이 정치 쪽을 오래 했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정치부라고 생각해서 능력을 보고 발탁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기자는 23년의 기자생활 중 16년 반을 정치부에서 보냈다. 그가 정치부 기자를 시작했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디 여자가 정치부를...’이라는 인식이 만연했다고 한다. 그랬던 당시부터 최 기자는 정치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이후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정치부장까지 지냈다. 이에 최 기자는 “여성 기자의 전형적인 경력은 아니”라며 “오랫동안 기자를 하면서 생긴 상당한 발언권을 어떻게 쓰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가진 펜의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해 최 기자는 다음의 원칙을 세웠다. ‘약자, 소수자를 위해 쓰겠다’, ‘편을 들지 않고 가장 첨예한 권력 이슈를 쓰겠다’는 것이다. 주류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최 기자 원칙은 그가 쓴 글에 잘 녹아들어 있다. 지난 2017년 발행된 관훈저널에서 그는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당시를 회고하며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빈소에 조화를 보냈을 때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아무나 위로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지난 대선 시기에는 <대선후보가 다 싫어서 절망하는 당신에게>라는 칼럼을 써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는 <대통령 윤석열의 ‘능력’은 어디서 왔나> 등의 칼럼을 쓰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따끔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여성, 노동자, 빈곤 문제 등 소수자에 관한 이슈를 꾸준히 다뤘다.
정치부장으로 선임된 이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자로서의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일보 동료 기자와 함께한 인터뷰에서 최 기자는 “이 세상 절반이 여성이면 당연히 편집회의에서도 여성의 수가 늘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다양성 이슈나 소수자에 대한 아이템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관철하는 데에 힘을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부장을 지내며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해 묻자 그는 “인터뷰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그뿐만 아니라 “된 후에도 데스크 스스로도 그런 아이템을 찾아내 기획하고 발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바쁜 기자 생활을 보내면서도 그는 한국여성기자협회에서 활동하며 이사, 감사직을 맡아왔다. 올해는 협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최 기자는 “기자 후배들, 특히 여성 기자 후배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산다”고 말했다. “후배들이 덜 억압받고, 덜 차별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하다”면서 “스스로 그 환경의 피해자인 것도 사실이지만 더 일찍 태어나 먼저 입사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협회 활동은 급여나 활동비가 없는 봉사활동임에도 그가 바쁜 시간을 쪼개 활동하는 이유였다.
이렇게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관해 묻자 그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면서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도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와 같은 여성 동료, 여성 지인들이 겪는 문제가 대부분 ‘여성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여성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자는 아니”라며 “제 발언권을 통해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에 관심이 있고 그 범주 안에 여성도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글을 읽으면 단단한 힘이 느껴지면서도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듯한 친근함이 든다. 칼럼에 관해 묻자 최 기자는 “기사도 칼럼도 쏟아지는 시대에 비슷비슷한 글은 쓰지 않겠다는 점을 가장 중시하며 쓴다”고 말했다. 이어 “칼럼은 기본적으로 주장과 관점을 담는 글”이라며 “저의 주장과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칼럼을 읽고 설득까진 안 되더라도 납득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쓴다”고 밝혔다.
이런 마음으로 쓴 글이어서인지 그의 칼럼 댓글을 보면 공감을 하는 사람도,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지만 최 기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 정치부 차장으로 일하던 2019년 10월 3일자 한국일보 칼럼 <‘기레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면>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다. “이 글을 쓰겠다고 했을 때, 동료 여럿이 말렸다는 것을 밝혀 둔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도 썼다.” 이 구절을 통해 기자로서 그가 중요시 하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매일 매일이 변곡점 같았다는 그는 “힘센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또 한 명의 기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기사, 그런 억울함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다. 그의 칼럼을 읽은 한 독자는 “옛날에 스크랩했던 이 글이 생각나서 왔어요. 기자님 좋은 기사 감사해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쉬이 쓰지 않은, 진심을 담아 쓴 최 기자의 글은 독자들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